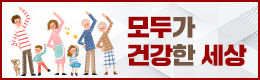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론 세계 최저 수준이다.
그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들이 숱하게 거론됐다. 그중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지만 아직은 실행이 요원해보이는 게 있다. 바로 비혼출산과 동거 가족 형태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사회적 관습과 편견에 부딪쳐 본격적으로 나서지는 못한 어정쩡한 상태다.
어버이날인 8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저출산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도 비혼 출산이 많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려고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해야만 아이를 낳기 때문에 혼인 건수가 많아지면 합계출산율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비혼출산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어떨까.
여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비혼출산율은 41.0%다. 나라별로는 프랑스 65.2%, 노르웨이 58%, 스웨덴 57.8%, 덴마크 54%, 영국 51.4%, 미국 39.8%, 호주 36.5% 등이다. 반면 같은 해 우리나라의 비혼출산율은 3.9%였다. 2023년에는 4.7%로 소폭 올랐다.
우리나라의 비혼출산이 현저하게 낮은 것은 무엇보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출산은 ‘미혼모’,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또 '동거' 가족 형태에 대한 편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요즘 젊은층에서는 비혼출산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점점 확산하면서 자발적으로 비혼출산을 하는 여성도 늘고 있다.
비혼출산의 방식으로 정자를 공여받아 보조생식술을 통해 출산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대한산부인과협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보조생식술을 통해 임신하려면 혼인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어야만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이 윤리지침을 차별로 판단하고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비혼 여성도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립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부부’에게 한정된 난임 시술의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 비혼 상태에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지원이 가능하도록 비혼여성 보조생식술과 자격, 지원, 의료기관 등을 규정한 것이다.
◇비혼출산을 막는 장벽
한반도미래연구원이 지난 4월 3일 ‘비혼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장에서는 “비혼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년 개선되고 있지만, 비혼출산에 대한 지원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통계청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중은 37.2%로, 12년 전(22.4%)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중심으로 돼 있어 비혼여성의 출산 및 양육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 기존의 혼인 중심 정책을 넘어 비혼출산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차별과 편견 없이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발제자로 나선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은 민법의 ‘혼인 중/외 출생자’ 구분과 출생신고서 기재가 사회적 차별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민법은 자녀 출생 시 부모가 법률혼 관계인지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로 구별한다”며 “출생신고 시부터 아이에게 낙인을 찍고 이를 명시해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차별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또 “비혼동거 당사자는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주택 공급 등에서도 소외되고, 의료기관에서도 비혼 가족은 진단서 발급이나 수술동의서 제출 등에서 가족관계 증명이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다”며 “비혼관계 등록·증명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윤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전략커뮤니케이션팀장은 “비혼출산은 자의적인 것인데 개념이 혼용되며 미혼모, 미혼부를 비혼출산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과 더불어 비혼출산이라는 카테고리를 새롭게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유럽의 ‘동거’ 가족형태 지원
서유럽에서는 비혼 출생률이 많게는 우리나라의 10배 가까이 높다.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스와 아이슬란드로 이런 나라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또한 상당히 높고 성평등지수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아이슬란드는 합계출산율이 1.72명이며, 이중 비혼 출생률은 70%나 된다. 이 나라는 14년째 성평등 국가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 전 분야에서 성 격차가 가장 낮은 국가이자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높은 나라다. 프랑스는 비혼출산 비율이 65%, 출생률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1.79명이다.
OECD 비혼 출산 평균은 41.9%, 합계출산율은 1.56명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이자 세계 최저다.
서유럽 국가들의 비혼출산은 보조생식술 지원이 아니라 ‘동거’에 대한 인정에서 나온다.
이 나라들은 동거 커플에게도 등록만 하면 법률혼 부부와 똑같은 지위와 혜택을 부여한다.
프랑스는 1992년 출산율이 1.74명으로 당시 한국(1.76명)보다 낮았는데, 1999년 비혼 동거를 등록받는 ‘팍스’(시민연대계약, Pacte civil de solidarité·PACS)를 제정하고 23년 후인 2022년 1.80명으로 올라섰다. 이 제도는 두 이성 또는 동성 성인이 결혼은 하지 않았어도 동거상태임을 신고하면 사회보장이나 복지 분야에서 법률혼 부부와 같은 지원을 받는다. 프랑스에서는 법률혼보다 동거 형태가 훨씬 많다.
동거 커플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경우 남성은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자동으로 획득할 수 없으며, 별도 친자 확인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 친권이 성립된다. 다만, 친권 성립 1년 이후라면 공동 양육권 획득이 가능하며, 부모 상의에 따라 누구의 성을 따를지 결정할 수 있다.
팍스는 해지도 수월하다. 파트너 한쪽이 계약 파기를 원해 집행 서류를 시청에 보내면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끝난다. 각자 재산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없으며, 개인 호적에는 독신의 지위가 유지되고, 법적인 기록도 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