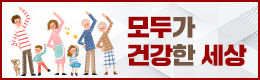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날씬함에 대한 선망과 무분별한 처방 관행 속에서 ‘살 빼는 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20~3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환자 수는 다소 줄긴 했으나 1인당 처방량은 줄지 않아 ‘의존성 약물’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환자 수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성별·연령별 격차와 의존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대 여성의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는 13만3135명으로 그 전년 대비 10% 감소했고, 30대 여성은 23만6481명으로 6% 줄었다. 하지만 같은 연령대 남성과 비교하면 격차가 극심하다.
20대 여성은 남성(1만6437명)보다 8.1배, 30대 여성은 남성(3만8786명)보다 6.1배 많았다.
더 큰 문제는 ‘의존성’을 보여주는 처방 패턴이다. 지난해 30대 여성의 1인당 처방량은 225.6정으로, 2023년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모든 연령·성별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대 여성의 경우 2023년 1인당 처방량은 177.4정, 2024년은 176정으로 1.4정 줄어드는 데 그쳤다. 제제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복용량이 줄지 않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장종태 의원은 이에 대해 “식약처가 ‘3개월 이내 단기 처방’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권고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식욕억제제는 의사의 엄격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대부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펜터민’ 계열로 디에타민, 아디펙스 등이 널리 복용되는데 뇌의 시상하부에 작용해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고 포만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식욕을 억제한다.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원리라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입 마름, 불면증, 두근거림, 손 떨림, 그리고 예민함이나 불안감 같은 감정 변화다. 뇌를 인위적으로 각성 상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놓이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장기간 복용 시에는 내성과 의존성이 생길 수 있고, 약을 갑자기 끊었을 때 심한 피로감이나 우울감을 겪을 수도 있다.
최근에는 위고비, 삭센다와 같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GLP-1)에 작용하는 주사제나, 두 가지 성분을 합쳐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를 높인 큐시미아 같은 복합제가 사용되고 있다.
식욕억제제는 미용 목적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 의원은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엄연한 마약류”라며 “단기간 체중 감량 효과는 있으나 장기 복용 시 우울감·불면·심장 질환 등 치명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가이드라인 강화와 함께 식욕억제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범사회적 교육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