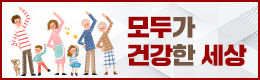한국헬스경제신문 | 오동진 영화 평론가
딱 30년 된 영화지만 고 박철수 감독의 <삼공일 삼공이>는 여전히 현대적이고 혁신적이다. 30년 전 박철수는 ‘뉴 코리안 시네마’의 기치를 내걸었고 이후 이창동과 박찬욱, 봉준호 등이 나왔다.
그는 선구자였던 만큼 죽음의 순간도 섬광 같았다. 그는 2013년 2월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음주 운전자의 차에 치여 즉사했다. 영화 <삼공일 삼공이>는 폭식과 거식증에 관한 얘기이다. 30년 전에는 그 개념이 흐릿했으나 지금 와서는 분명해졌다.
폭식과 거식은 이음동의어(異音同義語)이며 동전의 앞뒷면이다. 특히 폭식과 거식은 둘 다 공히 자본주의적이라는 측면을 지닌다. 둘 다 돈이 든다. 폭식은 당연히 음식값이 들어 가며(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은 배달 앱 하나에만 연간 약 4300만 원을 쓴다), 거식으로 가는 와중에 하게 되는 다이어트에도 돈이 들어간다. 사람들은 피트니스 클럽에 가고 각종 비만 치료제, 다이어트약을 산다(비만 치료제 시장은 2028년에 가면 480억 달러, 약 56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의 경향은 거식보다는 폭식이 인기 대세이다. 누가 누가 더 많이 먹고, 더 잘 먹되 오히려 살은 찌지 않는지, 그 기현상에 대해 대중들은 큰 관심을 보인다. 일종의 오아시스 신드롬이다. 분명 착시인데 동경하게(찾아 헤매게) 된다.
영화 <삼공일 삼공이>는 외형적으로 보면 301호에 사는 여자와 302호에 사는 여자의 우정 어린(?) 비극에 관한 얘기이다. 301호 송희(방은진)는 지금으로 말하면, 요리를 잘하는 개그맨 정종철(마빡이, 옥동자) 같은 사람이다. 정종철은 ‘살림왕 옥주부’란 유튜브를 통해 자기 요리가 진심임을 자랑하는 인물이다. 송희는 그 진심을 뛰어넘는다. 그녀는 남편과 이혼 과정에서 극단의 행동을 저지른 적이 있다. 남편이 애지중지하는 강아지를 요리해 그에게 먹였기 때문이다.
송희는 남편을 위해 온갖 요리를 했으나 그가 자신을 피하자 스스로 대식가가 됐고 당연히 살이 쪘으며, 또 당연히 남편과 더 거리가 생겼다. 부부는 결국 식용 개 사건 이후 이혼했다. 이 정도쯤이면 요리에 진심인 것이 아니라 요리에 목숨을 건 정도이다.
302호에 사는 윤희(황신혜)는 안 먹는다. 특히 그녀는 고기라면 진저리를 치는데 그건 그녀의 의붓아버지가 부처(butcher), 곧 정육점 주인이었기 때문이다. 계부는 윤희를 강간했다. 그 트라우마로 윤희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러다 점점 더 다른 것까지 먹지 않는다.
이런 윤희에게 송희는 고기에 뭐에 잔뜩 먹을 것을 공급한다. 한쪽은 상대를 먹이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한쪽은 먹기만 하면 죽을 것 같다. 먹느니 차라리 죽고 싶어 한다. 302호 여자 윤희는 참다못해 301호 여자 송희에게 극적인 제안을 한다. 송희는 결국 윤희를 ‘요리’한다.
현대 의학에서 폭식은 절대적으로 경계한다. 거식 또한 심각한 질병이다. 정확한 병명은 신경성 식욕부진이다. 신경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건 일종의 정신병이라는 얘기이다. 실제로 거식증은 우울증을 동반한다.
우울증은 매우 위험한 병으로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말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감이 모태가 될 수 있다. 거식증과 우울증이 겹치면 치사율이 20%까지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의 핵폭탄급의, 극도로 위험한 질병이 된다.
거식증은 대체로 완벽주의적 성벽을 지닌 사람들이 걸릴 확률이 높다. 식욕을 억제하다 결국 모든 음식을 거부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체로 음식을 넣자마자 구토하는 경우가 많다. 폭식가, 혹은 대식가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치부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저 위가 다른 사람보다 (비정상적이나마) 커서 나타나는 행동 증후군으로 본다. 그럼에도 신경성 식욕부진처럼 신경성 대식증 역시 정신적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질병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오히려 많이 먹은 후에는 식욕부진의 증상을 보인다(많이 먹는데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토해 내기도 한다). 쯔양의 정상 체중, 마른 몸매 유지 비결은 그녀가 ‘엄청나게’ 먹은 후의 일상을 관찰한 후에야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폭식가 혹은 대식가이든 아니면 거식증 환자이든 그 모든 것은 결핍에 따른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다. 송희는남편의 사랑이(그것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결핍돼 있었다. 그녀는 그 점에 열등감을 느끼고 끊임없이 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시달려 왔다. 송희에게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모멘텀은 음식을 만들고 스스로 먹는 것, 아니면 만들어서 그(남편)를 혹은 누구를 먹이는 것이다. 윤희의 신경증 역시 진짜 사랑, 올바른 인간관계에 대한 결핍감이 원인이 된다.
그녀는 자신의 ‘혐오스러운’ 몸이나 사람 관계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리셋하고 싶어 하고 자신을 점점 더 말라비틀어지게 하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인, 현대 여성의, 일종의 ‘미용병’은 모두 결핍과 열등감, 인정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보여 준다.
영화 <삼공일 삼공이>는 이미 30년 전에 2020년대의 수많은 미용, 성형 중독증의 심리적 원류를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탁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장정일의 시 「요리사와 단식가」를 모티프로 했다. 당시 무명이었던 감독 이서군의 시나리오가 출중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박철수 감독의 이단적 작품관이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 낸 셈이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가. 혹은 무엇을 먹지 않으려고 참고 있는가. 먹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영화는 유튜브 한국고전영화 채널에서 작품 전편을 감상할 수 있다.
* 이 기고는 대한보건협회 <더행복한 건강생활>과 함께 제공됩니다.